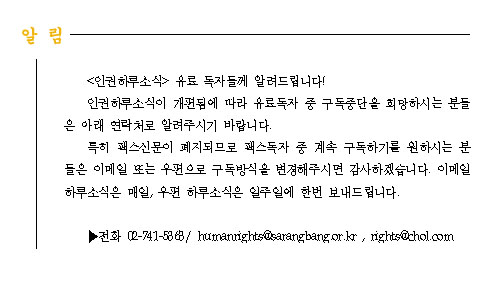내가 인권운동사랑방에 처음으로 간 것은 작년 가을경이다. 나는 '사회교사'가 되고 싶었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에서 듣는 수업이 '사회교사'가 되는 것과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랑방의 '인권의 역사' 강좌 안내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인권의 역사'를 들으러 사랑방에 갔고, 강좌 후 뒤풀이 자리에서 '인권교육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뒤풀이 자리에서 '인권교육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랑방이 해온 활동들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나는 '운동'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고민하는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궁금해져서 사랑방에 간 것이다. 그리고 뒤풀이 자리에서 '인권교육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길래, 인권교육실의 근예언니에게 "그래요?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라고 물었다가 얼떨결에 교육실 회의에 합류. 이것이 인권운동사랑방, 그리고 인권교육실과 나와의 만남이었다.
사랑방과 인권교육실의 활동에서 내가 접하는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새로움이다. 인상적인 기억중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은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알바 모여라’라는 행사를 했을 때이다. 행사 프로그램 중, 알바현장에서 청소년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역할극 해보기가 있었는데, 각 모둠별로 주어진 상황을 짧게 연기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 중 한 청소년이 모두의 시선이 쏠리는 부담감에 못 이겨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전히 시선은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상대방 역할을 맡으신 분의 마무리로 상황이 무마되었는데, 자리에 앉은 그녀는 결국 울고 말았다.
뒤쪽에 앉아있던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청소년 인권‘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건데,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역할극을 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쉬는 시간에 그녀와 이야기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다음 순서가 시작이 되었고, 행사가 끝나게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나는 뒷정리를 하느라 물건들을 챙겼는데, 그 사이 참석했던 청소년들은 모두 돌아갔다. 행사가 끝난 자리를 정리하느라 어수선하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아차 싶었다. 물건들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찾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사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표가 아니었는데 말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다행히 다른 교사분과 활동가분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청소년’과 ‘어린이’, 그리고 ‘인권’과 함께 만난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움이다. 능숙하다거나 순발력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다.
요즘에 인권교육실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담은 책을 만드는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 노동, 위계, 이주노동자, 환경, 공권력, 사회복지, 장애, 전쟁과 평화 등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책 속에 녹아있다. 그런데 사실 고민은, 그것들이 나에게도 ‘고민’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오지 못해왔으며, 삶 속에서 그러한 고민들이 녹아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전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하자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책을 만드는 작업에 함께 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아이들과 혹은 청소년들과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이다. 답이 쉽게 나올 리가 없다. 나 스스로의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나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고리들과 ‘인권’이 만날 때에, 그것이 현실과 부딪히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교사 - 교사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관계는 ’서로가 나누는‘ 관계이다 - 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서,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거기다 ‘쉽게’, ‘전달’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오랫동안 사용해 오지 않은 감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사랑방의 ‘자원활동’과 접하는 고민도 이 지점이다. 내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걸까? 사실 나는 뭔가 활동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디어를 얻고, 고민을 하기 위해 사랑방에 간다. 능숙한 활동가들을 보면서 ‘별로 도움도 안되는데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에게 이것이 ‘활동’이다. 사랑방에서 하는 일들을 ‘돕기’ 위한 자원 활동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대로 경험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다. 나에게는 여전히 고민의 시간들이 필요하며, 그 고민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맞닿아 있다. 내가 정말로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움직일 것인가.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고민이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보다 더 섬세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과 -그 사람이 아이이든, 청소년이든, 혹은 어른이든 -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이것이 내가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교육실과의 만남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