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말고 네 몸을 읽겠어“
20세기 들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여권 제도는 21세기가 되면서 그 목적에 더욱 충실한 수단이 되고 있다. 9/11 테러의 비극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경통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은 신분증과 공항에서 생체정보(얼굴‧지문 등)를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강요해 왔다. “종이로 된 신분증명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너의 몸을 가지고 너를 확인해야겠어.”
미국이 정해준 시간표에 맞추어 일본, 유럽연합 등의 주변국들은 모두 생체여권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미국의 ‘베스트 후렌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 전 생체여권을 도입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켰다. 이제 생체여권을 들고 출입국심사대 앞에 도착한 개인은 신뢰할 인격이 아니라 검사의 대상이 된다. 기계가 인간을 판독하는 셈이다. 인권은 이제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되었다. 인권이 국경 앞에 서는 순간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발행하는 지구인등록번호
인권의 몰락은 신체의 일부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생체여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생체여권은 자신을 검사해줄 시스템과 쌍을 이룬다. 사실 내가 누구라는 것 또는 나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내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거나, 그들이 정해준 기준을 묵묵히 잘 따라줄 것이라거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테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신원(identity)을 넘어 생각(idea)마저 검증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뇌를 열어볼 수는 없기에 미국은 여행자들의 행동(behavior)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록(record)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록의 집적이 검사시스템으로 걸러지는 순간 여행자들에게는 또 다른 역사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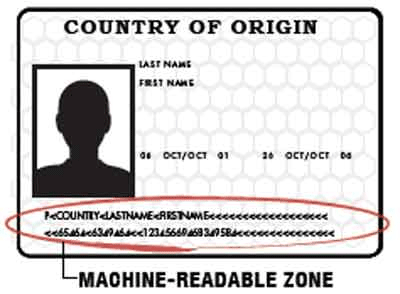
▲ "새로운 여권을 분실하는 것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처 : http://biopass.jinbo.net)
미국은 이미 여행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비자발급일자, 체제지 주소 등 미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저장·관리·분석하고 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구체적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쉬워진다.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이런 정보들의 식별자(identifier)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인에게 부여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라고나 할까?
출입국심사의 자동화는 차별의 자동화
이동기록과 전과기록은 미국이 가장 탐내는 정보들이다. 개인의 이동을 재구성하는 것은 그 사람의 테러가능성을 유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전과기록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동기록은 전 세계의 항공사들로부터 개인의 탑승기록(PNR)을 넘겨받음으로서 채워지고 있고, 전과기록은 비자심사의 과정에서 수집된다. 또는 비자면제의 조건으로 전 국민의 전과기록에 대한 조회권한을 요구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이 그런 권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3월이면 협정이 체결된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비자면제를 위해 넘어가는 셈이다. 이제 인권운동은 국민국가 안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대테러를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행위자인 ‘미국’까지 대응해야 하는 고민 앞에 놓여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테러리스트 감시리스트(watch-list)를 구성한다. 감시리스트에 누가 기록되고 있을까? 빈 라덴이 “내 지문 여기 있소, 나중에 미국 갈 때 걸러내 주시오” 하고 지문이라도 찍어 보냈을까? 감시리스트는 미국의 취향일 뿐이다. 백인보다는 흑인이, 기독교인보다는 무슬림이, 돈 많은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감시리스트에 기록된다. 그러므로 출입국심사의 자동화는 사실 차별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반인권 상호주의’
미국의 모범을 일본과 영국이 이미 따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런 요구-이주민의 지문을 채취하라거나 여행자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라는-들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일본의 여행자 지문채취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른바 ‘반인권 상호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반인권 상호주의를 계속하다보면 반인권의 세계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편리’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생체여권과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은, 지구 곳곳에서 국가의 존재를 우리의 신체에 각인시키고 있다. 국가라는 거부할 수 없는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너의 이동을 허락해 줄 권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너의 신체를 목록화 하여 재고조사 대상처럼 취급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줄 세우고, 측량하고, 합산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국가라는 존재가 있다고. ‘편리’는 실재하고 있다. 국가의 ‘편리’일 뿐이지만.
덧붙임
김승욱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