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은 2018년부터 해마다 조직점검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회의’를 주제로 사랑방을 돌아봤다면, 올해는 ‘쉼’을 키워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활동이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많이 나누어봤지만 쉬는 것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려니 참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색함 때문에 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보다 각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영역으로만 여겨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 쉬는 것도 역량이 필요한 일인데 너무 개인에게 맡겨왔다는 생각을 확인하고 조직점검의 주제어로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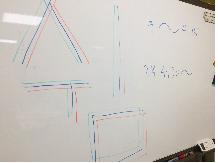

잘 쉬고 있나요?
사랑방에서 활동하면서 잘 쉬고 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이라고 하는 일의 특성 때문입니다. 성명서를 쓰고, 원고 마감을 지키고, 집회를 준비해서 치르고 나면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공부까지 전부 ‘활동’이라고 부르는 ‘일’을 해나갑니다. 문제는 활동이라는 일의 형태가 수량이나 시간을 단위로 분절되지 않으면서 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몸은 출퇴근을 하지만 현안에 대응해야 하거나 마감을 맞춰야 하는 일이 함께 출퇴근하지는 않기 때문에, 활동가에게 일과 쉼의 경계가 뚜렷하기 힘든 특성이 있는 것이죠. 마음은 뿌듯한데 몸이 피곤한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 되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활동가라는 직업이 원래 그런 직업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활동가도 직장인처럼 출퇴근 시간에만 일하는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지속가능한 활동의 조건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에 눈감아 버리기 쉽고, 후자는 활동가라는 직업이자 삶의 방식에 대한 제 선택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랑방과 같이 대표나 직급이 없는 조직구조에서는 일과 쉼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출퇴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몰아서 쉬기
그렇다고 저를 포함한 사랑방의 활동가들이 일에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가 워크숍의 주제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일과 쉼의 경계가 흐릿하니 주말과 평일의 구분 없이 여러 일정과 마감이 몰려서 일하게 되는 패턴이 쉼의 패턴까지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자는 것이 조직점검 워크숍의 주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을 통으로 휴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방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길게 휴가를 내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미리 휴가를 계획해서 일정을 통으로 비워서 쉬지 않으면 중간에 밀고 들어오는 일정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일주일씩 쉬는 장기 휴가를 권장하고 사용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몰아서 일하게 되기 쉬운 조건에서 몰아서 쉬는 패턴은 일면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몰아서 쉬다 보니 쉬지 않는 시간에는 저녁, 주말 상관없이 일에 쫓기는 일의 패턴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정들을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소화하고, 쉴 때는 평소에 못 쉰 억울한 마음을 더해 최대한 활동과 멀어지기 위해 애쓰며 쉼과 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잘 쉬기도 결국은 관계
그래서 사랑방은 어떻게 하면 몰아서 쉬기보다는 일상에서 잘 쉬면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결국 도달한 결론은 관계였습니다. 사랑방 활동에 한에서는 일상적으로 잘 쉬기 위해 저녁이나 주말에 일한 만큼 휴가를 많이 주는 보상체계를 촘촘하게 갖춘다고 잘 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활동가 사이에서 서로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관계일수록 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일이 몰려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결국 이 일을 덜어주고 함께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랑방에서는 동료 활동가들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헉헉거리고 있다고 옆자리 활동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면 몰려드는 일의 부담을 나누어 짊어달라는 이야기를 건네기도, 또 실제로 나누어 짊어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일상적인 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쉴 때 나의 빈자리를 커버해줄 수 있는 동료 관계가 전제되어야 잘 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하지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워크숍의 논의가 과연 사랑방 활동가들이 조금 더 잘 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도 직급도 없는 조직에서 쉼을 만드는 방식은 결국 구성원 사이에서 약속을 만드는 과정이자 동시에 조직의 지향을 드러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쉼도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애매한 이야기만 오갔지만, 애매한 만큼 다른 직장과 같이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쉼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숙제는 워크숍의 논의를 어떻게 서로의 약속이자 지향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가 되겠지요. 이를 위해 워크숍의 후속 과제로 휴가제도를 새로 써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존에 보장하던 휴가 규정의 내용을 손보기보다는 조직의 지향을 담아내는 문장으로 새로 써보자는 것이죠. 쉼 이야기를 하다가 과제가 또 하나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무척 기대가 되는 과제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