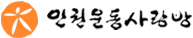해미
청소년 시기 한창 나의 방에 가족이 들락날락할 때가 있었다. ‘관심과 애정’이라는 명분과 ‘관리와 감시’라는 감각 사이에서 나는 불편함을 크게 느꼈고, 지면에 공유하지 못할 쌩-난리를 몇 번 친 후에야 내 공간을 오롯이 나의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단순 사춘기가 아닌, ‘나’를 확보하기 위한 첫 선언 아니었을지.
몽
필요한 일,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재밌어 보이는 일을 하나하나 쌓다보니, 어느새 실패한 테트리스 게임이 되어 가고 있는 일정표를 보며…! 요즘은 무언가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익숙해져야 할 때 같다. 하지만 내가 연락하는 사람에게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선언 ^_ㅜ
미류
<공산당선언>을 읽고 ‘선언’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처음 느낀 듯하다. 그 후의 시간은 선언이 동사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든 <존엄과 인권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또다른 의미에서 동사로서의 선언이었다. 기억되는 만큼, 박제되지 않는 만큼 선언은 살아있다. 선언을 살아있게 하는 건 선언문이 아니라 함께 선언하는 사람들이다.
대용
선언은 눈보다는 입으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잘 들어온다. 적어도 4.16인권선언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읽어본 나의 경험은 그러했다. 조금은 당연해 보이는 글자들이 나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하여 말로 내뱉어질 때, 선언에 담고자 했던 의미가 읽는 나에게 더욱 강렬하게 전달 된 것이다. 살면서 한 번쯤 궁금했던 선언이 있다면 꼭 소리 내 읽어보길 추천.
민선
활동하면서 우리의 지향, 다짐을 새기며 만든 선언들이 여럿 스쳐가는데, 2017년 홈리스야학에서 권리교실을 마무리하며 만든 <우리가 함께 쓴 홈리스인권선언>을 소개하고 싶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마”, “무료급식 공짜가 다가 아냐. 원하는 만큼 먹고 김치만이 아니라 반찬이 골고루 있어야 해”, “병원 갈 때 혼자라고 무시하지 마. 장애인이라고 깔보지 마.” 존엄하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야학 학생들이 8가지 요구를 엮었다. 선언을 큼직한 현수막으로 만들어 그해 겨울 동짓날 홈리스추모제에서 펼치고 함께 외쳤고, 이후 매년 추모제에서 홈리스인권선언이 갱신되고 있다.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 선언이 가지는 의미이자 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