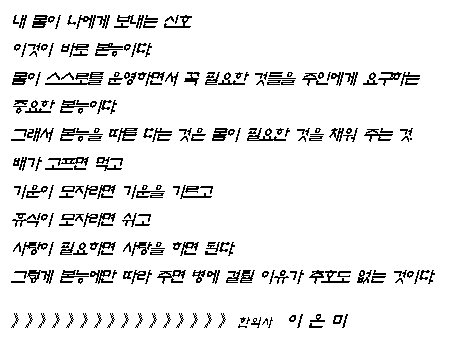검사 중에도 단순한 염증 정도라고 생각했으나 검사 후 내게 내려진 병명은 왼쪽 가슴은 섬유선종, 오른쪽 가슴은 혹(다른 전문 용어가 있었으나 잘 기억이 안 난다)이었다. 종양 제거를 위해 수술일정을 잡고, 상담실을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타고난 건강체질은 아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해 왔다고 자평하던 나 아니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람.
한마디로 내 몸이 날 배신한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사무실 일들을 어떻게 정리하지, 누구한테 어떻게 일을 맡기지, 가뜩이나 다들 일이 많은데.... 수술비는 어떻게 하지. 안나프르나 트레킹을 위해 모아둔 돈을 수술비로 날리다니....'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와 마음은 복잡해졌다.
1박2일간의 병원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내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술 전의 걱정은 통증과 함께 사라졌고, 내가 살아온 생활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국선도를 하면서 호흡?의념수련 중에 내관(內觀)을 해왔으나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고, 내 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재대로 듣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퇴원 후 집에서 보낸 시간동안 먹고 자고 수술자국 아물기만을 바라는 것 외 딱히 할 일도 없는 나는 무엇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그냥 묵상했다.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가부좌를 한 후 그 무엇에 나를 집중하면서 명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편린들 가운데 묵상이 이루어졌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낮잠에서 깨어날 때,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남서쪽의 하늘이 붉은 기운을 내뿜고 있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사라지고, 당시 내가 머리? 가슴?몸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나기 시작했다. 또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달아나기 위해서, 에고(ego)를 감추기 위해서, 무엇에 기대고 의존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기대고 의존하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 내 몸을 힘들게 했음을 바보같이 몰랐다. 그동안 내 몸이 보내오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 내 감정의 욕망, 상처로부터의 도피를 충실하게 따랐던 것 같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궁금하실 것이다. 이제, 몸의 소리를 잘 듣고 있냐고. 물론 아프기 전보다는 귀를 잘 기울이는 편이다. 나의 변화는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안나프르나 못 가도 별로 아쉽지 않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된다. 지금 나는 건강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