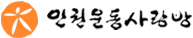몽
나는 여대를 나왔다. 당시 총학생회가 나서서 ‘학생 복지’를 내걸며 ‘SKY’대 남학생들을 초대해 미팅을 주선하는 행사를 열었고, 여성학 동아리를 만들었던 선배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학교와 총학은 염치가 없었고 행사는 모욕적이었으며,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에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다.
미류
공공. 나는 일단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 수영장을 꼽고 본다. 공공이 왜 더 나은지 실컷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수영장과 역사가 거의 같은 강사님이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저 저렴하고 질 좋은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 고민. 공공, 쉽지 않지만 그래서 도전할 만한 것.
대용
운동권의 자식으로서 공공성이란 말이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거 같다.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그것, 그것이 바로 공공성! 아닌가?’ 하면서 말이다. 공공성이 붙으면 무조건 좋고 옳은 것으로 생각했던 거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공짜가 좋아서였던 게 분명하다. 혹시 아직도 난 공짜가 좋아서 실현이 어려워도 이왕이면 공공성이 맞다며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미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공공(公共) 하면 공산주의가 먼저 떠오른다. 윤리와사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그럼 공산주의는 팬티도 나눠입어요? 내 팬티가 쟤 팬티고 그런 거예요?”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다. 선생님은 그런 건 아니라고 답해줬는데, “팬티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야” 답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민선
물놀이 나온 어린이들로 공원 놀이터가 북적인다. 내가 기억하는 ‘공공’의 첫 경험이 놀이터겠다 싶었다. '뺑뺑이' 하나 있는 공터에서 누구라도 어울려 놀았다. ‘휠체어 그네’를 처음 봤을 때 누구나의 놀이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 갈등의 공간이 된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기사를 보며, 모두의 자리로 '공공'을 경험하는가에 사회의 모습이 좌우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