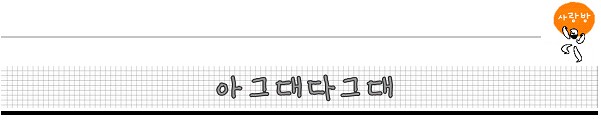
3월에는 “내 인생의 술”을 아그대다그대 이야기합니다.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급기야는 술이 사람을 먹을 단계까지 술이 취한 뒤에는
내 안 깊숙이 숨어있던 또 다른 내가 나와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나의 활약상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하는 곤혹감.
술먹던 탁자에 오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래방의 벽을 타고 오르는 스파이더맨이 되었다던지,
승용차 지붕 위를 건너뛰기 했다던지,
바래다 주는 후배가 걱정되게 나 잡아봐라며 도망쳐서
아닌 밤중에 술래잡기를 하게 했다던지 하던 얘기들,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정말 나일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체력이 밑받침되지 못하니,
술 취하면 곯아떨어져 잔다.
그래서 또 다른 나는 활동하지 못한지 참으로 오래되었다.
(래군)
 친구들과 모자라지 않게 술을 먹고 다니던 시절의 가슴아픈 이야기.
친구들과 모자라지 않게 술을 먹고 다니던 시절의 가슴아픈 이야기.
그날 아침도 나는 힘차게 일어나서
신선한 오륀지 주스를 한잔 마시고 학교갈 준비를 했지.
음~
어제 술을 좀 마셨지만,
쌩쌩한 걸~ 좋아~!
그때는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나선 다음,
지하철을 갈아타고 학교에 가게 되는 적이 많았어.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와 함께 좌석버스에 타고 나란히 앉았지.
근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속이 마구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야.
나의 <술먹은 다음날~♬>을 아는 사람은 알지. 아~ 나~ 이것 참.
몸이 좀 이상하다 싶었으면 따로 나왔을 텐데,
아침에 괜찮다싶어 아버지랑 함께 나왔더니 갑자기 속이 배신을 한 거지.
그래도 웬만하면 참아보자고 생각하고 좀 더 갔어.
그러나 역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
결국 아버지께 "잠깐 먼저 내릴 께요." 했지.
아버지는 다른 말씀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더군.
그리고는 운전석으로 가서, "아저씨,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지금 좀 내릴 께요." 했어.
아저씨가 안내려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웬걸, 바로 버스세우고 내려주시더군.
그리고 내리자마자 전봇대를 붙들고 마구 오바이트를 했지.
그때 토하느라 정신이 없어 멍해진 내 눈에 비친 건...
천천히 떠나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아들래미 아침부터 길가에 토해대는 모습을 보시던 아버지의 눈빛...
눈빛...
(아해)
 술먹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
술먹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
새벽의 광화문을 뛰어다니거나.
도로한복판에서 절을 한다거나,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수많은 고민들 중 술에 대한 고민이 많다.
술을 마시면 드러나는 수많은 추태들,
그런 것에 긴장감을 가지며 그리고 성찰하며 마셔야겠다.
조금 진지하게 술을 먹지 말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아쉽다. (재영)
 나를 운동권(?)으로 여기는 주변 지인들은
나를 운동권(?)으로 여기는 주변 지인들은
처음 만났던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잘 못 마시는 것에 대해
무척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생긴 모습은 한 술 하게 생겼나보다.
그 신기함은 곧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는데,
술로 친해지는 정취를 나와 공유할 수 없다는
그들의 강변을 듣고 얼마간은 나도 술을 마셨던 것 같다.
그런데
곧 이어지는 괴로움
(속 쓰림, 오바이트,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 등)은 더 이상 술로
나의 위를 채우지 않게 했다.
술 말고도 인간이 서로 친밀해지는 공유지는 많으니까.
그런데,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너무 피곤해서 내 의식이 또렷해질 때면,
맛있는 술이 먹고 싶다.
다행히,
지난 설에 사촌오빠가 가져다준
장인이 만든 술이 베란다에 잘 보관되어 있다.
(승은)
 술 먹는 걸
술 먹는 걸
타락의 죄로 여기는 기독교 근본주의자 + 간염보균자였던 대학신입생 시절,
술을 먹지 못한다는 콤플렉스와
술을 먹지 않는다는 우월의식(?)으로 뒤범벅이던 나는
모든 '어른'과 '선배'들을 두려워했고
모든 곳에서 겉돌았다.
그런 내가
힘들어하면서도 동문회엔 꼬박꼬박 나가고,
결국 술을 먹기 시작한 것은
찌질이를 벗어나 그들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술을 먹는 걸로 해결되지는 않았고 건강만 버렸다 ㅎㅎ.
10여년이 흐르면서 술과 인간관계에 대한 콤플렉스는 많이 해소되었고,
이젠 다만 계절에 따라
맛있는 술을 먹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소주잔에 물만 마시면서도 자리엔 늦도록 남아있는 습성,
그 시절 익힌 생존의 방식인 듯 하다 ㅋ
(유성)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3~4월엔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3~4월엔
어김없이 '무슨무슨 대학 누구누구가 술 먹고 사망했다'는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곤 했다.
내가 새내기였던 그 해 4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첫 엠티에 갔다.
그땐 왜 또 사발식이 그리 많았던지.
'막걸리 사발식'도 아닌 '소주 냄비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
그동안 난 병원을 두 군데나 옮겼고,
그때마다 구급차 신세를 졌으며,
뇌단층 촬영을 하기도 했다.
선배들은 '우리가 후배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고,
때마침 외할아버지 제사로 서울에 모여 있던 모든 친척들까지 총출동~
난 죽을 뻔 했는데,
사람들은 재밌다며 놀림감으로 삼았다. -_-;;
그래도 사람들과 술 마시면서 어울리는 게 좋아
지금도 열심히 마시고 있다. ㅎㅎ
(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