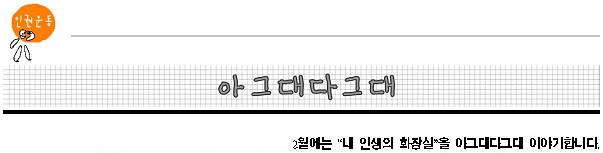
 음...
음...
6,7살쯤 됐을까?
어릴때 화장실에 관한 귀신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대문 옆에 있는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을 보던게 생각이 나네요..
볼일 보고는 문 닫을 새도 없이
냉큼 뛰어서 나가는 바람에
화장실 문이 자주 활짝 열려 있었더랬죠..
(명수)
 올초
올초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들른
금강휴게소 화장실.
앞산에는 눈이 덜 녹았고
그 앞으로 금강이
느릿느릿 흘렀다.
올해는 금강처럼 흐를 수 있을까?
(준)
 초등학교때
초등학교때
학교에서 화장실을 갔더랬죠.
그 때만 해도 푸세식 이었는데
화장실 문을 여니
사람 손이 똥통 속에서 쓰윽 올라왔다는 것.
그 때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남들은 헛것을 보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난 그게 귀신 손이라고 믿고 있음
(유라)
 #
#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을 뛰어 들어갔지.
빈 칸으로 들어가서
왼발로 딛고 오른발을 더 벌렸어야 하는데,
그때 친구 이름 부르다가
(문밖으로 얼굴 내밀면서)
오른발 변기 안으로
푸욱 빠졌어.
으아~
그 다음은 기억 안 나네.
#
그리고 한 두해 후...
양궁을 할 때였지.
보통 3살씩 10회를 쏘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몇 회 남아서 참고 10회째 3발 다 쏘고,
그때 그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그 앞 층계를 대여섯계 오르다 그만
바지에 싸버렸어.
그 느낌 아실라나...
뜨끈하게 적셔오는 촉감을^^
나쁘지 않아.
(일숙)
 이제는 예전이 되어버린,
이제는 예전이 되어버린,
장수에 있는 콩새(예전엔 백은관이라 불렀지)네 화장실.
그냥 시멘트 바닥에 발 올려 놓는 커다란 돌덩이 두개 달랑 있어
어찌나 당황스러웠던지.
근데 냄새 하나도 안나던
그 화장실 진짜 신기해.
재가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한다니 놀라워~~~
(둥실둥실달)
 원래도 술을 잘 못하던 내가
원래도 술을 잘 못하던 내가
한낮에 수업 땡치고 학교 장터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사라지는 바람에
친구들이 한참 찾으러 다니다가
변기를 끌어안고 토악질을 하던 나를 발견해서 나를 부르니,
내가 돌아보며
씨익~ 웃더라는,
그 화장실? ^-^ 씨익-
(아해)
 똥돼지가 아래서 닦아준다는 화장실 가본적 있나?
똥돼지가 아래서 닦아준다는 화장실 가본적 있나?
난 있지롱~
물론 내가 어렸을 때
이미 돼지들도 사람을 가려서 닦아주지는 않았지만,
그 공포는 은근히 강렬했다구.
돼지우리 한켠에 돌을 쌓아올려 발을 딛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싸는 거.
초등학교 다닐 즈음까지
할머니 댁에 그런 화장실이 있었다우.
그러던 어느날 똥돼지가 돼지우리를 뛰쳐나와
마당을 사납게 돌아다녔는데~
할머니가 다시 우리로 몰아넣으셨지.
그 기억까지, 흠흠, 그 두려움에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게 되는군.
(미류)
 강화도 한 레스토랑의 화장실.
강화도 한 레스토랑의 화장실.
바닷가 절벽에 바짝 붙어 있던 레스토랑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음식을 시켜놓고
급하게 볼 일 보러 들어간 화장실.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일을 보게끔 한 주인장의 나름 배려.
음식 식는 줄도,
밖에서 기다리는 일행도 잊은 채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엉덩이를 까고 있노라니
온갖 시름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네~~
히히
(초화)
 난 콩새네서 보기 훨씬 전에 농활 가서 봤더랬지.
난 콩새네서 보기 훨씬 전에 농활 가서 봤더랬지.
이름하야 '골프 화장실' 들어는 봤나?
맨 밑 바닥에 재 가루를 뿌린 다음 똥을 싸.
그리고 그 위에 쭉정이를 덮어서
삽으로 스윽 쳐서 뒤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다고 해.
그러니까 등 뒤로 한 가득 똥이 쌓여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훌륭한 퇴비가 되는 거래.
그래서 옛날에는 똥 마려워도 참고
자기네 집에 와서 일봤다잖아.
하지만 둥실둥실달 말대로 냄새가 그리 심하진 않았다는 거.
농활 가서 변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얼굴이 노래져 있었거든.
그랬더니 변비약을 권하더라구.
그거 먹고 배만 아프고 식은 땀만 삐질삐질.
인삼밭에서 일하다가
결국 급하게 찾아 들어간 화장실이 바로
문도 안달리고 돌만 두개 놓여 있는 화장실이었어.
너무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어.
급한 마음에 앉기는 앉았는데
누가 볼까 신경은 쓰이지,
오래 앉아 있으려니 다리는 아프지.
결국 농활 내내
한 번도 일을 못 봤다는 슬픈 이야기지.
(씩씩마녀)
 울 엄마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외갓집은
울 엄마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외갓집은
부산 어느 달동네였어.
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명절이면 외갓집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고 그 뒤 이사를 했어),
화장실이 인근 동네 사람들이 다같이 쓰는 공동화장실이었지.
삐걱대는 나무문이 엉성하게 달린.
난 냄새도 냄새지만 구더기가 너무 징그러워서
작은 것은 집 마당에서 싸고,
큰 것은 꾹꾹 참았어.
그때, 화장실 때문에
외갓집에 가지 않겠다고 엄마한테 때 쓴 것이
정말 후회가 돼.
울 엄마가 십수년을 살았던 집이었는데.
(시소)
 화장실 하면 낙서.
화장실 하면 낙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짝궁은 쌀집 아들내미였어.
첫사랑까진 아니더라도 마음을 처음으로 설레게 만든 아이였지.
그 아이랑 어찌나 다정하게 지냈던지
같은 반 녀석들이 게슴츠레한 눈으로 보는 건 당연지사.
어느 날 학교 화장실 벽에
'얼레리꼴레리 경내랑 누구는 사랑한대요♬'라는 낙서가 덜컥.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발개졌지만
왠지 뿌듯하기도 했어.
그 낙서 써준 친구를 찾아내면
꼭 술한잔 사야지.
그 때문에 얼마나 어린 마음이 두둥실 떠올랐던지..
ㅎㅎ
(개굴)
 시골에는 자연 화장실이 널려 있어.
시골에는 자연 화장실이 널려 있어.
소변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고,
대변을 보고는 밑을 뭐로 닦나?
옛날에 무슨 화장지?
신문지도 별로 없던 때,
그 자연에서 풀잎으로 처리하고는 했지.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의 진수는
막 푸어낸 화장실에서 똥이 떨어질 때
반작용으로 똥물이 튀는 거야.
그걸 잘 피해야지.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그걸 잘못해 바지에 똥물을 맞아서
창피당한 꼴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우.
그 친구랑 25년만에 만났는데,
학교 교감하고 있더라구,
머리는 다 희었고.
(래군)
 음,
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원에서 광명시로 이사와 고1까지 살았었는데,
그 집은 정말 오래되어 난방도 화장실도 정말 '퐈'였었어_
(한편)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던 아빠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1시간은 기본!
감감 무소식이었나니,
아침이면 화장실에 먼저 가겠다고
모든 식구들이 아우성이었지ㅎ
도저히 못 참겠으면
집밖 완전낡은 화장실에서,
코 막고 헐레벌떡 볼일만 보고 나왔는데_
그날따라 이상스레 여유부리며 집밖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았어_
두리번두리번 살피다가
발견한 뽀얀 부스러기들!!
세상에 누가 여기서 라면을 부셔먹었대~
라며 유심히 살펴봤는데
((-_움, 하얀 라면 부스러기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야!
완전 기겁 : 그대, 상상이나 되는가?
일 보다 그대로 얼어버린 깜찍한 어린이의 모습이!ㅋ
그때 구더기를 처음으로 봤다는ㅎㅎㅎㅎ
(그래서 그런지, 얼어붙기 전후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
라면 부스러기라고 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거길 빠져나왔는지도 말이지_ㅠ))
그후 구더기를 떠올리면 완전 징글징글 :
근데 얼마 전,
한 동료가_ 지렁이 화분에 생긴 구더기들을 햇볕에 말려 죽이며
새삼 얘네도 '새끼'인데 이렇게 어여쁨을 받지 못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_
많이 끄덕여지더라구!
뭐든 어린것들은 참 귀여운 법인데ㅎ
(괭이눈)
 예전에 스위스 로잔에 갔었다.
예전에 스위스 로잔에 갔었다.
어떤 까페 화장실을 갔는데,
도대체 남녀를 구분할 수 없어서
일단 들어간 곳이 남자 화장실이었다.
아뿔사~
남자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를 기다리느라
귀를 종긋 세우며 노심초사한 기억이 난다.
그 까페가 좀 예술적인 곳이었는데,
화장실을 디자인한 사람의 안목이
지금도 궁금할뿐이다.
(승은) 

